노후 준비의 첫걸음으로 시작하는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하나의 계좌에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정석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미래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운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의 연금계좌가 놓는 덫
우리가 연금계좌를 하나의 통장으로만 관리하면 그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돈이 뒤섞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4가지 재원이 한데 섞여 관리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퇴직금 (IRP의 경우)
-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 운용 수익
문제는,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이 돈들을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 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 순서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즉 세금이 없거나 적은 재원부터입니다.
- 1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세금 없음, 인출 한도 없음)
- 2순위: 퇴직금 재원 (퇴직소득세 적용, 연간 인출 한도 내에서 30% 감면)
- 3순위: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 (연금소득세 3.3%~5.5% 적용)
유리한 순서대로 인출되니 좋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3,0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순위 재원이 모두 소진된 후, 2순위 퇴직금 재원마저 바닥나면 3순위 재원에서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3순위 재원은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닌 16.5%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는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세금을 아끼려면 1,500만 원만 인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계좌를 분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처음부터 재원의 성격에 따라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재원을 지정해서 인출할 수는 없지만 특정 계좌를 지정해서 인출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 A계좌 (세액공제용):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만 모으는 계좌
- B계좌 (비과세용):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만 모으는 계좌
- C계좌 (퇴직금용): 퇴직금만 받을 전용 IRP 계좌
이 경우 매년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A계좌에서 저율과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인출하고 모자라는 1,500만 원은 세금이 없는 B계좌에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6.5%의 높은 세율을 피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실제 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입금 전략을 세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 A. 세액공제용 연금저축펀드: 연 600만 원 납입
- B. 세액공제용 IRP: 연 300만 원 납입 (총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충족)
- C. 세액공제X 연금저축펀드: 연 900만 원 추가 납입
- D. ISA 계좌: 연 2,000만 원 납입 후, 3년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
퇴직금 IRP 미리 만들어 숙성시키기
퇴직금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더욱 영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던 IRP 계좌로 받으면 재원이 섞여버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만을 위한 별도의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략은 퇴직하기 한참 전에 미리 퇴직금용 IRP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소액(예: 1,000원)이라도 입금해 계좌를 활성화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퇴직금의 연간 인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인출 한도는 “연간인출한도= 계좌평가액×120% / (11−연금수령연차)” 같이 계산되는데 여기서 연금수령연차가 중요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만 55세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IRP를 개설하면 수령연차는 1년차부터 시작하지만 50세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두었다면 60세에 퇴직금을 받아도 수령연차는 6년차로 인정받습니다.
분모가 작아지니 당연히 연간 인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더 많은 금액을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 분리 vs 통합! 정답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계좌 분리가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연금 자산이 매우 큰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누는 것보다 한곳에 모아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500만 원 인출 한도를 넘겨 16.5%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더라도 더 큰 금액을 더 오래 굴려 얻는 복리 수익이 세금보다 클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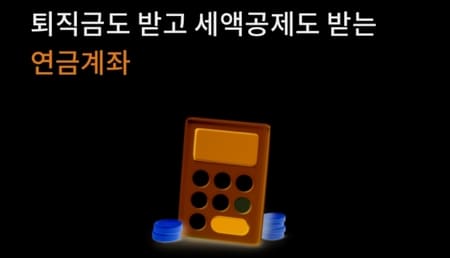
하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사적연금 인출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 분리를 통해 저율과세(3.3%~5.5%) 혜택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당장은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중한 내 연금을 인출해야 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금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쥐여주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연금계좌 현황을 점검해보세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자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먼 미래의 퇴직금을 위해 미리 IRP 계좌를 하나쯤 터놓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30년 후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계좌를 목적에 따라 분리하는 것은 당장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미래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현명한 장기 전략입니다.
은퇴 후 자신의 소득 상황과 필요 자금에 맞춰 인출 계획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기술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산 관리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글]
- 저가 커피 창업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
- 실비보험 필수일까? 병원 거의 안 가는데
- 아파트 전세 대출, 얼마까지가 아닌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개인연금, ETF 노후준비 포트폴리오, 순서가 잘못되진 않았나?